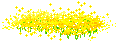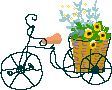다산 (라디오 특강)을 듣다가...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성지곡을 돌았다. 박석무 이사장의 다산 실학 강의를 들었다.
돌아와서 강의 내용을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잠깐잠깐 정리해 본다.
박석무 이사장 강의 중 인용한 구절들을 정리해 둔다. 훗날에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서...
라디오 강의 제2강 실학관련 부분에서....
주자는 명덕을 경전해석에 있어서 추상적인 이치를 들어가며 관념적으로 설명했다.
明德者는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하여 以具衆理 而應萬事者也니라.
그러나 다산은" 행동", "실천"을 강조했다.
주자는 관념론적으로 해석했다면, 다산은 경험론적으로 해석.
仁을 주자는 仁者, 心之德 愛之理라고 해석
다산은 “인이란 사람이니 두 사람이 인을 행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면 인이다. 임금과 신하가 각자의 직분을 다하면 인이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면 인이다. 인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나온다…”(仁者人也二人爲仁 父子而盡其分則仁也 君臣而盡其分則仁也夫婦而盡其分則仁也 仁之名 必生於二人之間 :『논어고금주』) 인(仁)이라는 글자가 사람(人)이 둘(二)임을 근거로, 참으로 쉽고 분명한 해석을 내림
茶山은 「直心之修行」으로 풀었다. 곧은 마음을 지니고 행동으로 닦아 나가는 것을 德으로 보았다.
다산은 경학연구서, 해석서를 232권(나중에 더 밝혀진 것 까지 하면 240여권)
위당 정인보는 다산의 경학을 민중적 경학이라고 규정
이하 박석무 이사장 글을 베껴와 저장해 둠
[101] 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인(仁)과 덕(德)
글쓴이 : 박석무 날짜 : 04-11-22 10:14
유교(儒敎)의 본질적인 목표는 인과 덕을 실현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은 무엇이고 덕은 무엇일까요.
공자(孔子)나 맹자(孟子)는 인이나 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자나 맹자는 말과 행동이 바로 인이자 덕이기 때문에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오래되자 공맹의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직 문자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뒷세상에 오면서 인과 덕을 풀이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니, 그렇게 경(經)을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경학(經學)이었습니다.
공자나 맹자는 인(仁)이란 인(人)이라고만 간단하게 말했을 뿐인데, 주자(朱子)에 이르러 ‘사랑의 이치’(愛之理)니, ‘마음의 덕’(心之德)이라는 관렴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산에 이르러 인이란 글자 모양대로 ‘사람(人)이 둘(二)이다’라고 풀이하여 두사람 사이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嚮人之愛)이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부자(父子), 형제(兄弟), 부부(夫婦), 사제(師弟) 사이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 직접 사랑하는 일이 인이라는 행위개념으로 풀이됩니다.
다산은 덕(德)도 글자대로 ‘행오지직심’(行吾之直心 = 行十直十心)이라 풀이하여 ‘나의 곧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김’이 바로 덕이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덕이 없다.’(不行無德)라는 행위개념으로 덕을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효제(孝弟)나 충신(忠信)이나 인의예지(仁義禮智) 모두를 몸소 행하지 않으면, 즉 궁행(躬行:躬 몸 궁 /行 행할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덕이 존재 하겠느냐 라는 반문을 던졌습니다.
실천철학이자 행동철학인 다산의 사상은 그러한 경전의 해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무리 주장해보아야 전혀 소용이 없고, 오직 옳고 바른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인간의 값이 실현된다는 그의 뜻이 높기만 합니다. 행하는 일, 실천하는 일, 그것만이 역사를 바꾸는 일임을 다산은 가르쳐주었습니다.
박석무 이사장의 또 다른 글(역시 베껴 옴)
[207] 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인(仁)에 대한 새 해석
글쓴이 : 박석무
유교(儒敎)의 창시자는 공자(孔子)였습니다. 유교가 실현하려던 최종의 목표는 인(仁)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 중의 하나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仁)은 인(人)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더 자세한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더 확대하고 발전시켰던 맹자(孟子)도 그대로 인은 인(人)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나 맹자는 자신들이 말하고 행하는 일이 바로 인(仁)이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공맹(孔孟)의 도(道)가 펴지지 못하고 사회와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지면서 인(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맹(孔孟)의 경전을 실제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그래서 경학(經學)이 발전하게 됩니다. 경(經)을 풀어서 해석하는 연구와 학문이 다름 아닌 경학이었습니다. 『논어』에 “군자(君子)는 근본에 힘쓰고 근본이 세워져야 도(道)가 나타나니 효제(孝弟)란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어』에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효제가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산이 살던 시대의 유자(儒者)들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네 알맹이가 사람의 5장6부처럼 사람의 뱃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행동이 배제된 인(仁)의 해석을 단연코 반대한 사람이 다산이었습니다.
주자(朱子)가 “인이란 사랑의 이치이고 마음의 덕이다(仁者 愛之理 心之德)”라는 설명에 부합하려던 모든 해석을 완전히 부인하는 입장이 다산의 해석이었습니다.
“인(仁)이란 두 사람이 함께 함이다. 어버이를 효로 섬기면 인을 함이니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다”라고 해석해서 형과 아우, 임금과 신하, 부부와 붕우 모두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행동이 바로 인(仁)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배제된 어떤 것도 유교의 본령이 아니라는 다산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하는 일이 현대인들이 할 일이 아닐까요.
박이사장의 또 다른 글
|
어질고 의로운 선비가 되자 |
|
|